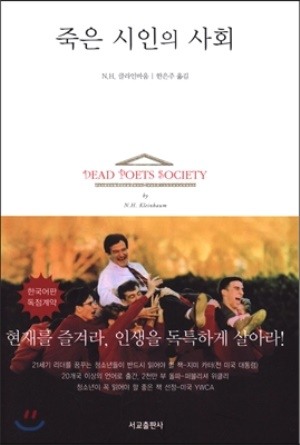
한국에서는 2004년 번역출간된 N. H. 클라인바움의 소설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보다 늦게 나온 까닭에 영화장면이 표지에 실려 있다.
# 키팅 선생님, 카르페 디엠(Carpe Diem) 등으로 유명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1990년)는 좀 독특하다. 보통 원작소설이 영화화되는데, 이는 거꾸로다. 영화가 크게 히트하자, 소설이 나온 것이다(원작 소설이 없기에 아카데미상에서도 각색상이 아닌 각본상을 받았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쓴 톰 슐만이 쓴 소설이 있고, 전문소설가인 클라인바움의 손을 거친 작품이 있다. 후자만 읽어 본 까닭에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클라인바움의 것이 더 낫다고 한다. 어쨌든 영화나 소설이나 ‘죽은 시인의 사회’는 참교육, 진짜스승 등의 수식어가 따라붙는 교육명작이다.
#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부탁인데 꼭 좀 기사를 크게 써서 고인의 농구사랑을 널리 알려주세요.” 9일 아침 밤을 새운 000 선수는 목이 잠긴 채 이렇게 말했다. 8일 밤 대스승인 전규삼 전 송도고 코치가 88세를 일기로 타계했다는 소식을 듣고 만사를 제쳐놓고 빈소인 인천의료원으로 달려가 뜬눈으로 밤을 보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0년이 다 됐지만 아직도 000에게 고 전규삼 옹은 ‘영원한 스승’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상은 2003년 5월 9일 기자가 한 스포츠신문에 쓴 글의 앞부분이다.
# 생뚱맞게 14년 전 글을 찾게 된 것은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000과 통화를 하면서 고 전규삼 옹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000은 이름을 대면 바로 알 수 있는 농구인이다. 굳이 익명으로 처리한 것은 그가 언론에 이름이 나오는 것에 대해 아직도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공식활동도 하는 만큼 주변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스스로 더 자숙이 필요하다고 한다. 어쨌든 000에 따르면 올해도 어김없이 전규삼 옹에 대한 추모행사가 열렸고, 그의 이름을 딴 초등학교농구대회도 2014년부터 계속 열리고 있다. 이쯤이면 스포츠계에서 스승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 “플로터, 스텝백 점프슛, 페이더웨이... 지금 생각해도 대단하다. 어떻게 그 시절에 그런 기술을 가르칠 생각을 하셨을까”(김동광). “팀 성적보다 아이들의 학교성적이 떨어지는 걸 더 싫어했다”(유희형). “할아버지는 절대 혼내지 않았다. 백패스 훅슛 등 무엇을 하든 혼내지 않으니 창의적인 플레이가 나왔다”(최호). “농구뿐 아니라 기계체조도 가르쳤다. 신체밸런스 등 신체의 기초를 잘 갖춰야 한다며 매트를 깔아놓고 구르기, 튐틀 등을 했다. 심지어 낙법까지...”(정태균). 군사문화가 횡행하던 시절 학원스포츠에서 감독 코치의 말 한 마디는 독재자의 그것과 같았다. 개인이 없던 시절, 전규삼은 자율을 강조하고, 팀플레이보다는 개인기지도에 주력했다. 호칭 자체도 할아버지였다.

농구계에서 참스승으로 여겨지는 고 전규삼 옹. [사진=송도고 농구부]
# ‘송도고의 할아버지 코치’로 유명한 전규삼 옹은 1915년 황해도에서 출생했다. 일본 호세이대(法政大)를 졸업하고 개성 송도고 교사로 부임했으며, 6·25전쟁 후 인천 송도중고 개교를 주도했다. 1961년 일반교사에서 전담 농구코치로 변신한 전규삼 옹은 81세인 1996년까지 35년간 선수들을 지도하며 1,000여 명의 제자를 길러냈다. 당장의 승부를 떠나 기본기에 충실하고 창의적인 농구를 중시하는 ‘생각하는 농구’가 그의 지론이었다. 또 한 번도 제자들에게 매를 들지 않았으며 선배의 후배 구타도 ‘송도’에서는 금기시됐다. 청렴하게 산 까닭에 학교를 떠난 후에는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 “체벌을 가하면 당장은 고친다. 그렇지만 일주일 있으면 또 못한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또 때리면 면역력이 생겨 1대가 10대가 된다. 그런데 스스로 느끼면 창조적인 플레이가 나온다. 시간이 걸리지만, 자기 것이 되면 영원히 이어진다.” 전규삼 옹의 말이다. 우리네 현실에는 아직도 스포츠계 폭력이 남아 있다. 그는 또 “먼저 사람이 돼라”며 학생선수의 본분을 강조했다. 훈련은 항상 수업을 마친 다음이었다. 그에게 농구는 교육이었다. 요즘 강조되는 학생선수들의 수업권 즉, ‘공부하는 선수, 운동하는 학생’과 다르지 않다. 전규삼 옹은 “우승해야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너희들이 여기서 우승한다고 크게 잘 되고 그런 거 아니다. 최선만 다해라”라고 주문했다. 대신 선수들의 장래에 대해서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모두 대학에 보내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일까, 제자들은 졸업 후에도 학교를 자주 찾았다.
# 앞서 소개한 2003년 전규삼 옹의 부고기사는 제목이 ‘영원한 스승 전규삼옹 별세…슬픔에 젖은 농구계’였다. 그는 스승을 넘어 아예 가족의 느낌이 드는 ‘할아버지’로 불렸다. 혹시나 세월이 지나면 퇴색이 될까 했는데 기우였다. 지금도 매년 추모행사와 추모대회가 열리고 있으니 말이다. 000은 이렇게 말했다. “할아버지를 기리는 대회가 없어지면 제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열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럴 걱정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 말고도 좋은 제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월트 휘트먼의 명시이자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명대사인 "오 캡틴! 마이 캡틴!"이 꼭 어울리는 이런 스승은 일 년에 한 번은 기릴 필요가 있다. [헤럴드경제 스포츠팀=유병철 기자]
sport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