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꺼풀이 없는 구슬 같은 눈망울, 목에서 부드러운 산호처럼 가지를 뻗은 아가미, 도마뱀 같은 몸통에 앙증맞은 팔다리, 손가락과 발가락, 올챙이 같은 꼬리…
외계생물처럼 보이지만 커다란 머리와 웃는 표정, 통통한 분홍빛 피부 덕분에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생물의 이름은 ‘아홀로틀’이다. 아르헨티나 소설가 훌리오 코르타사르는 아홀로틀이 되고 싶어서 오랫동안 그만 쳐다보고 사는 주인공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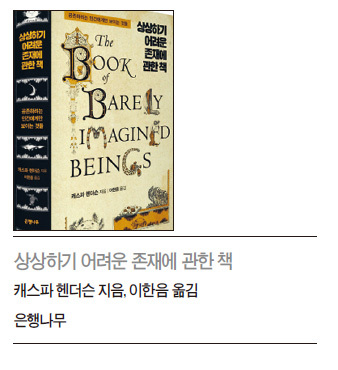
환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생물은 또 있다. ‘이리도고르기아’는 이 행성에 살고 있는 생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산호의 일종인 이리도고르기아는 작은 폴립이 모인 형태로 뿔 같은 물질로 된 가느다란 중심줄기의 꼭대기에 부채꼴 구조를 형성한다. 햇빛을 받는 얕은 물에 사는 몇몇 해양류는 금색, 자주색, 빨간색 등 화려한 색깔을 띠며 물살에 따라 부드럽게 휘어진다. 수심 1600미터가 넘는 바다 밑에 사는 이리도고르기아는 어둠 속에서 끌어올려 햇빛에 비추면 무지개 빛깔로 빛나는데 전체 구조가 대칭을 이루며 수학 정리에 나오는 도식같은 모습을 띤다.
환경인권운동가이자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캐스파 헨더슨의 지구상의 희귀한 생물에 대한 경이롭고 아름다운 고찰을 담은 ‘상상하기 어려운 존재에 관한 책’(은행나무)은 환상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생물들의 이야기로 우리의 시야를 열어준다.
대항해시대 유럽의 정복자들에게 짓밟힌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슬픈 초상이자 현대 재생생물학의 모티브가 되는 아호로틀, ’비너스의 허리띠’라는 별칭이 붙은 띠빗해파리, 설인처럼 털북숭이 집게발을 가진 예티게, 유독 선명한 배아 발달 과정 덕분에 세포, 즉 우리와 모든 동물간의 기본적인 동질성을 생각하게 하는 제브라 피시 등 심해 밑바닥과 대륙의 메마른 곳 구석구석까지 숨어있는 경이로운 생물들의 이야기들은 대수조관을 펼쳐놓은 듯 화려하고 생생하다.

고생물학, 진화생물학, 신화, 철학, 예술을 넘나들며 지식과 상상력의 팔로 자유롭게 유영하며 각 생물의 다채로운 면을 보여주는 저자의 탐색은 단지 흥미로운 발견이나 호기심을 채워주는데 그치지 않는다. 저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각 생명체의 특질과 인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내 인간이 이들과 지구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 있다. 책에서 각 생물은 마치 인격체처럼 다뤄진다.
도룡뇽의 일종인 아홀로틀로 다시 돌아가면, 중세시대 도룡뇽에 대한 인식은 불과 관련이 깊다. 불에 타지도 않고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생물로 인식됐다. 이런 인식은 르네상스 이후 더욱 공고해진다. 현대 과학은 아홀로틀이 다른 도룡뇽 사촌과 마찬가지로 잘린 팔다리를 재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려준다. 재생의학자들은 이를 토대로 인간의 팔다리 뿐 아니라 장기까지도 복원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
거미불가사리는 뉴런이 모인 뇌가 없지만 관족, 가시, 집게발 모양의 차극을 통해 외부와 접촉하고 온도, 방향을 감지한다. 특히 표면에 빽빽하게 박혀 있는 안점들은 신경계와 통합돼 정교한 시각계를 형성, 하나의 거대한 겹눈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눈의 수정체는 방해석 결정으로 오래 전에 멸종한 삼엽충만이 이같은 수정체를 썼다. 말하자면 불가사리에게서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시각 기술 중 하나를 보고 있는 셈이다.
장수거북이가 알을 낳기 위해 뒷지느러미발을 유연하고 섬세하게 이용하는 모습은 인간의 팔처럼 보인다. 앞지느러미발은 혹등고래의 지느러미발처럼 거대하지만 뒷발은 작고 섬세하다. 거북의 기울어진 눈에서 흘러내리는 굵은 눈물은 사실 먹이와 함께 섭취한 염분을 배출하는 수단이지만 앎을 넘어 인간의 감성을 자극한다.
해저의 표면에 사는 생물들과 그 속에 사는 생물들 사이의 경계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노피오포어, 유난히 긴 앞다리와 털로 덮인 설인을 닮은 절지동물 예티케는 생물과 무생물 사이에 걸쳐있다. 저자는 이들이 먹이 알갱이를 안으로 밀어넣은 입을 보면 탐욕스런 기계를 보는 기분이라며 이것이 로봇과 로봇을 보는 우리의 태도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인간이 지구의 생물체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은 두가지가 있다. 잔인한 살육과 파괴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생물 자체가 지닌 고유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저자는 놀라운 정밀함과 우아함으로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집중한다. 그리고 그런 작업은 어느 정도 탁월하게 수행한 듯 보인다. 책은 존재의 본질과 진정한 공존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되돌아보게 한다.
이윤미 기자/






![“비트코인, 예전에 남친 말 듣고 샀는데 마이너스 77%”…사상최고 찍었는데 무슨 일? [투자360]](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4/11/22/news-p.v1.20241122.0cf61946edb24523a8f1c5a715bcae7d_T1.jpg?type=h&h=640)


![“父는 죽고, 친모와 결혼하고” 재앙같은 예언…당사자 아들의 기구한 사연[이원율의 후암동 미술관-오이디푸스 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4/11/23/news-a.v1.20241122.6f410829d2e847798d1f6f02d6796a42_T1.jpg?type=h&h=240)


![집 싸게 내놔도 파리날린다…서울 아니면 공공분양도 썰렁 [부동산360]](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4/11/23/ams.V01.photo.HDN.P.20241029.202410291101280984490757_T1.jpg?type=h&h=240)





![연예인에 빠져…“24개월 할부로 사더니” 전부 쓰레기통 행 [지구, 뭐래?]](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4/11/20/news-p.v1.20241120.bf9d50d5065347f3ba37696b2898bb31_T1.jpg?type=h&h=240)
![집 너무 안팔리자 아내가 꺼낸 말 “여보, 상가랑 아파트 바꿀까?”[부동산360]](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4/11/16/rcv.YNA.20241105.PYH2024110509190001300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