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썸 등 다른 업체, 나서기 어려워
 |
| 지난해 10월 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답변하고 있다. [국회 영상회의록 캡처] |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무려 17년 전 국내 첫 등장한 기프티콘 시장이 해가 거듭되며 무섭게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기프티콘 시장의 66%를 무려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0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현재 그 규모만 3조원을 훌쩍 넘죠. 축하를 하거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기프티콘 같은 ‘물품형 상품권’ 만한 게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오래된 기프티콘 서비스 역사만큼이나, 이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지적도 숱합니다. 그런데도 어째 바뀌질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점이 기프티콘 금액보다 낮은 상품은 주문할 수가 없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면 1만4000원짜리 디저트만을 먹고 싶어도, 2만200원짜리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기프티콘으로 구매할 상품 가격을 여전히 알지 못하기도 하고요.
 |
| 스타벅스 커피 [연합] |
기프티콘에 상품 가격을 표시하고, 지불 금액의 차액을 지급해주면 될 일인데, 왜 이 간단해 보이는 일이 쉽게 진행되지 않는 걸까요. 통상 기프티콘으로 통칭되는 물품형 상품권 시장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아주 복잡한 시장입니다. 그 이유를 한 마디로 말하자면 브랜드사인 본사·가맹점주·판매 플랫폼이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 때문이죠. 가맹점 비중이 높은 브랜드사는 기프티콘 발행사를 따로 두고 온라인 선물하기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매출을 일으킨 주체가 너무 많고, 새로 생긴 시장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미비해 하나하나 뜯어보면 개별 사업자마다 계약 상황이 천차만별인 겁니다. 그 사이 판매 플랫폼은 수수료만으로도 지난 5년 기준 수천억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물품형 상품권 차액 환급 요구에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꿈쩍 않던 카카오와 스타벅스 코리아가 왜 서비스를 개편하게 됐을까요.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스타벅스에서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을 주문해도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바뀐 배경에는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로 대변되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가 관건이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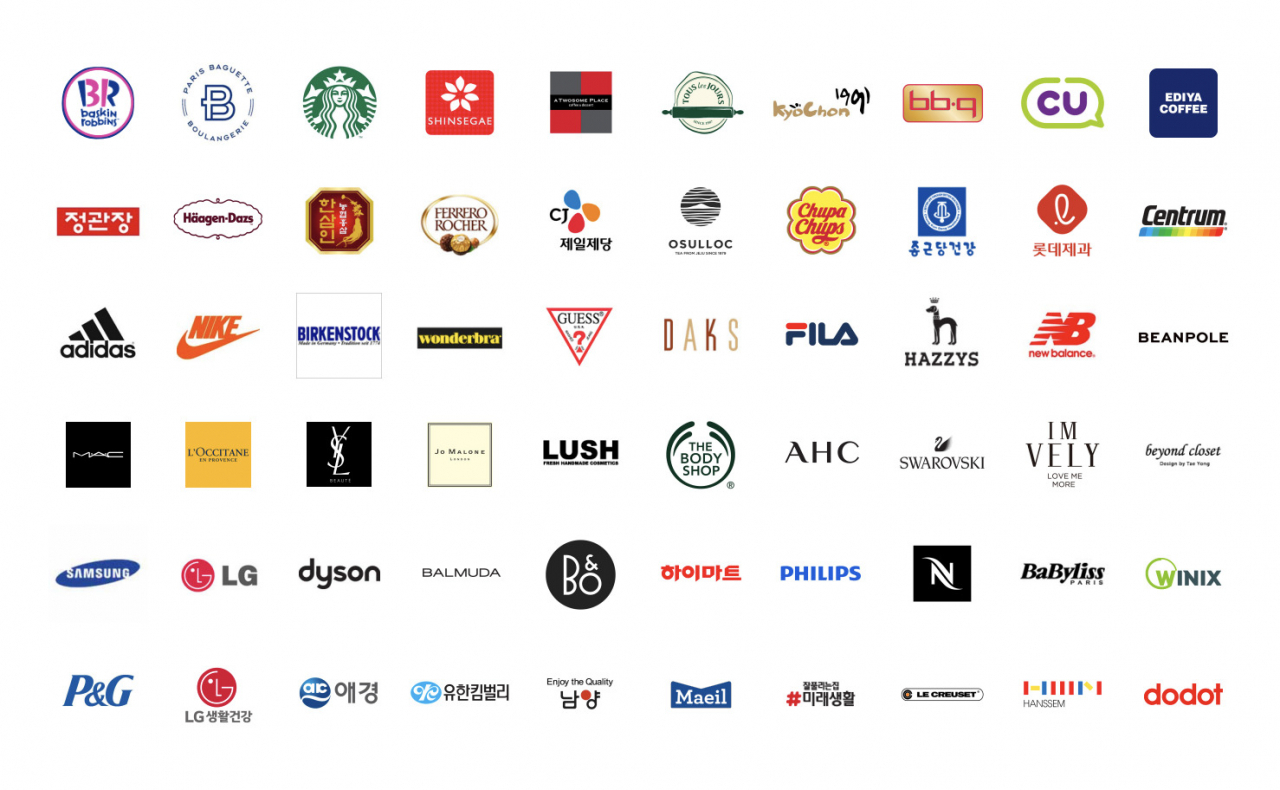 |
| 카카오톡 선물하기 파트너사 브랜드 로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 소개서 캡처] |
때는 바야흐로 지난해 10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 “스타벅스에서 가장 먼저 (기프티콘 차액 환급) 시스템 준비를 완료해서,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저희가 적용할 예정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말했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스타벅스한테 (국감에) 나오시라 했더니 항복하고 ‘카카오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라는 말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카카오와 스타벅스가 서로에게 책임을 회피하며 말하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프티콘 차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꾸면, 우선 가장 손해를 보게 되는 사업자는 가맹점주입니다. 가맹점은 기프티콘을 직접 발행한 게 아닌데도, 브랜드사에 판매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이는 본사인 브랜드사가 할인 쿠폰을 남발해 뿌리면 가맹점주가 가장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데요. 본사는 카카오로부터 기프티콘 판매 매출을 사후 정산 받습니다. 숫자상으로 매출은 일으켰지만, 아직 정산을 받지 못한 본사는 당장 가맹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것이죠. 자칫 가맹점주가 기프티콘 판매로 인한 비용을 떠안게 되는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
| 스타벅스 매장 [연합] |
이렇다 보니 가맹점주를 달래기 위한 용도(?)로서도 브랜드사인 본사에서는 기프티콘 차액 지급 서비스를 전면 개시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선물받은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손님들이 추가 현금 결제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야, 이는 곧 가맹점의 추가 수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스타벅스는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이 없습니다. 모든 매장이 직영점으로 운영·관리됩니다. 그렇다 보니 스타벅스 본사에서 기프티콘 발행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운영을 하는 커피빈·투썸플레이스·할리스, 더 나아가 파리바게뜨 등이 발행사를 두고 기프티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겁니다.
 |
| 남궁훈 전 카카오 대표 [카카오 제공] |
그래서 국정감사를 통해 압박을 받은 카카오가 스타벅스만큼은 기프티콘 서비스 개선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스타벅스도 사후정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안고서라도 기프티콘 차액을 스타벅스 카드로 적립하는 결단을 내린 것이고요. 실제로 올해 국정감사를 1주일 정도 앞두고 스타벅스는 “올해 12월 스타벅스 매장 POS(결제단말기)에 해당 기능 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안정화 이후에는 내년부터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스타벅스를 선례로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기프티콘 시스템을 개편하게 될까요. 당장으로서는 어째 요원해 보입니다. “가맹점주 의견 수렴, 시스템 변경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하여 논의해나갈 예정입니다.” 5일 헤럴드경제가 답변 받은 투썸플레이스의 입장이 업계의 입장을 방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수면 위로 이 문제를 본격 거론한 윤 의원은 온라인 선물하기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한 카카오와 브랜드사인 본사가 가맹점 경영 환경 개선에 일정 부분 협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 시장이 커지면서 유통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한 플랫폼사가 수익을 독식하는 구조는 더이상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카카오는 선물하기 환불 금액의 10%에 달하는 수수료만으로도 추가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그 금액만 따져봐도 지난 5년간 기준, 1300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dsun@heraldcorp.com
ds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