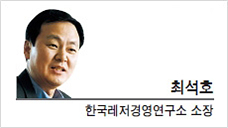
1574년 정월 율곡 이이 선생은 첫 번째 ‘萬言封事(만언봉사)’를 올린다.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있는 일곱 가지 방책을 적어서 밀봉하여 올린 상소다. 핵심은 공안·선상·군정 등 세 가지 개혁안이다.
백성은 토산물을 궁중이나 관청에 바친다. 토산물을 공물(貢物)이라 하고, 공물대장을 공안(貢案)이라 하고, 공물을 바치는 것을 공납(貢納)이라고 한다. 지방수령은 공안을 읽어 보고 부과된 공물을 지방관리 향리(鄕吏)에게 마련하게 한다. 공리(貢吏)는 향리가 마련한 공물을 가지고 서울로 가서 중앙정부 각사에 공물을 바친다. 중앙정부 이원(吏員)이 간품한다.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간품 과정에서 뇌물을 건네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물리는 방납모리가 만연한다. 부과된 공물 중에는 지방에서 나지 않는 물품도 많았다. 공물 구매를 대행한다. 구매를 대행하는 방납인(防納人)들이 먼저 공물을 바친다. 뒤에 몇 배로 받아낸다. 농민은 모든 부담을 떠안는다. 공안개혁이 절실하다.
서울에 있는 관청 종들만으로는 조정에서 해야 할 일(役事)을 다할 수 없었다. 지방 공노비를 서울로 불러들여서 번갈아가며 서울에서 일하게 했다. 지방 공노비를 뽑아서 서울 관아로 올려보내는 것을 ‘선상(選上)’이라고 한다. 서울로 올라온 지방 공노비는 밥도 제 돈으로 사먹어야 한다. 조정관리가 부패하여 선상을 고르게 하지 않았다. 뇌물을 받고 선상 노비 숫자를 제 맘대로 했다. 선상개혁이 절실하다.
변방을 지키는 장수는 애초에 돈을 주고 장수 자리를 산다. 그러나 녹봉이 없었기 때문에 사졸로부터 쌀이나 면포를 받아 생활한다. 농민은 사졸이 되어 군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 고을을 떠나 멀리 간다. 그래서 면포를 바치고 군역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 부패한 경저리(京邸吏)가 끼어든다. 경저리는 향리다. 해당 지방 농민이 져야 할 군역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지운다. 나중에 해당 농민에게 대역 비용과 이자를 세 배로 뜯어낸다. 농민 한 사람이 세 사람 군역을 지는 꼴이다. 군정개혁이 절실하다.
율곡은 개혁안을 적었다. 밀봉하여 상소했다. 공물을 쌀로만 바쳐도 간품 비리를 막을 수 있다. 조정에서는 농민이 바친 그 쌀로 공물을 구매한다. 쌀로 바치면 간품할 필요가 없다. 공리나 이원이 필요 없다. 방납모리꾼이 없어지니 방납 비리도 사라진다. 방납인의 농간도 없어진다. 공물을 쌀로 걷자! 그 쌀로 조정 각사에서 직접 공물을 마련하자! ‘공안개혁(貢案改革)’이다.
서울에 올라와서 몸으로 노역을 치르는 신역(身役), 즉 선상을 폐지하자! 대신 면포를 바치게 하는 신공(身貢)을 받자! ‘선상개혁(選上改革)’이다. 변방 장수들에게 나라에서 녹봉을 지급하자! 농민은 자기 고장에서 군역을 지게 하자! 시골 관리들이 군역을 빌미로 농민을 수탈하지 못 하도록 하자! ‘군정개혁(軍政改革)’이다.
율곡은 공안·선상·군정 등 폐정에 대한 개혁을 ‘경장(更張)’이라고 했다. 조선은 중쇄기에 접어들어 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깨질(土崩瓦解) 위기에 처했다. 조선을 새롭게 고쳐서 백성을 편안케 할 방책이다. 선조는 오랜 구법(舊法)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한다. 율곡은 구법이 아니라 ‘악법’이라고 했다. 홍문관 부제학 미암 유희춘 선생이 거든다. “이이가 상소한 대로 공물·선상·군정에 관한 일을 강구해서 시행한다면 백성이 곤고함에서 벗어나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정월에 1574년 정월을 생각한다. 율곡이나 미암 같은 분이 대통령되기를 기원한다.
최석호 한국레저경영연구소 소장
w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