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시험이 가능해지는 등 자율주행은 이제 눈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에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 분담은 아직 논의를 시작도 하지 못한 단계다.
국회 입법조사처 박준환 박사가 최근 내놓은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쟁점’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손해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750조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하지만 교통사고에 따른 책임은 운전자, 도로관리자, 차량 제조사 등 여러 주체와 관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일부 달리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민사적 책임주체를 일단 가해운전자로 간주한다. 그리고 도로관리자나 차량 제조사 등 운전자가 아닌 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이들의 책임을 운전자가 입증해야만 운전자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운전자가 과실의 입증책임을 져야하는 현행 법체계에서 첨단장치로 작동되는 자율주행차에 과실 혹은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통의 운전자가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과실의 입증방법 개선이 중요하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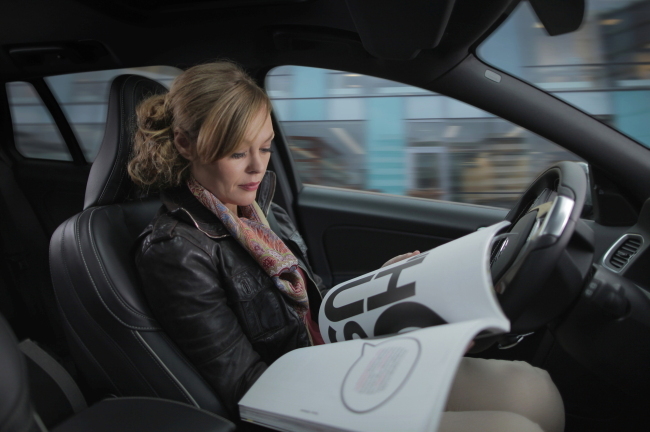
우선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된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적 정의 외에도 자율주행 정도에 대한 법적 구분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더라도 단계별 자율주행의 정도가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운전자의 개입도 가능하다. 따라서 사고 당시 차량을 실질적으로 제어하는 주체와 정도에 대한 구분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율주행차의 과실ㆍ결함 혹은 정상작동을 규명할 수 있는 ‘블랙박스’같은 장비를 의무적으로 차에 설치하도록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조건으로 자율주행 관련 센서의 정보를 적어도 사고 전 30초부터 저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험 가입 의무를 자율주행차 제조사에도 부과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자율주행차의 과실.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사가 손해배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배상을 위한 보험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자동차 제조사가 지는 의무는 주로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제품의 결함에 대한 책임에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현실화하기 위한 보험의 의무화가 검토되어야 한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