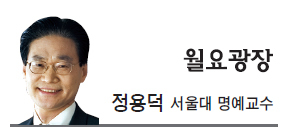 현대 행정학의 발전은 유럽에서 근대국가의 태동과 더불어 시작됐다. 이것을 19세기 말에 미국 학자들이 수입해 업그레이드 시켰고, 20세기 중엽부터는 전 세계로 역수출하게 됐다.
현대 행정학의 발전은 유럽에서 근대국가의 태동과 더불어 시작됐다. 이것을 19세기 말에 미국 학자들이 수입해 업그레이드 시켰고, 20세기 중엽부터는 전 세계로 역수출하게 됐다. 차례로 노벨상을 받은 사이먼(Herbert Simon)과 오스트롬(Elinor and Vincent Ostrom) 등 걸출한 학자들의 공헌이 컸다.
대개 미국의 행정발전을 위한 ‘미국 행정학’을 발전시킨 것이지만, 자신들의 이론이 모든 나라에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이 같은 생각을 비판하면서, 나라마다 행정의 생태(ecology)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 또한 다르게 이뤄진다는 학설이 릭스(Fred Riggs)의 ‘프리즘 행정(Prismatic Administration)’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는 (마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기 전의 상태처럼) 기능분화가 미미하며, 그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와 인적 분업 또한 미미하다.
반대로 근대적인 산업사회에서는 (프리즘을 통과한 빛의 무지개 색처럼) 기능이 세분되고, 그것을 담당하는 제도와 인적 분업도 세세하게 이뤄진다. 이 양극단 사이에 개발도상의 이행국가들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기능분화와 제도 및 인적 분화가 모두 (아직 프리즘 속을 통과중인 빛처럼) 어정쩡하게 낮다. 이런 생태에서는 선진제도를 도입해도 실제 행정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지난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서 국정을 마비시킨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비극적인 삶은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도대체 그는 기업인인가, 정치인인가, 아니면 두 가지 모두를 추구한 사람인가. 사업가로 성공하려 했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권력이 필요한 한국적 생태에서 어쩔 수 없이 ‘정치가형 기업인’이 된 것인가.
어느 경우든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기능분화에 걸맞는 제도분화와 인적분업이 덜된 개도국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1만 수천의 직종이 있다는 통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해방 이후 7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엄청난 기능분화를 일궈냈다.
그러나 이런 기능분화에 부합하는 제도분화가 미흡한 점에 문제가 있다. 기업을 하려면 정치권력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형적인 예다. 자연과학이나 문화예술 전문가가 더 적합한 직책까지도 일반직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것은 미분화된 행정의 예다.
가치관의 미분화도 문제다. 권력, 돈, 명예 모두에 대한 욕심이 그것이다. 대법관은 어느 나라에서든 직업위신(occupational prestige) 순위에서 최고의 위상을 차지한다. 그런 명예를 누리는 대법관들이 행정부 자리를 곁눈질하거나, 후에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예우’로 일확천금을 거둔다. 기본권 위배 등의 논란 여지를 넘어, 신임 대한변협 회장의 문제제기가 매우 신선한 이유다.
대학총장 또한 높은 직업위신을 누리는 직책이다. 그러나 극소수를 제외하면 한국의 대학총장들은 그의 학문적 업적과 명성을 바탕으로 우수 학생과 교수 그리고 발전기금을 유인하는 상징적 인물이 아니다.
정ㆍ관ㆍ재계를 넘나들면서 종횡무진으로 로비활동을 펴는 ‘권력중개사(power broker)’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 보니 핵심 권부에 진출한 전직 대학총장이 법규를 준수하려는 직업공무원들을 좌천시켜가면서까지 사익을 추구한 비리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기에 이른 것이다.
교수직이 학문을 위한 자리인지 정계진출을 위한 ‘뜀틀 자리’인지 분간 못하는 폴리페서들, 박사모까지 쓰고 싶어 안달하는 정ㆍ관ㆍ재계 인사들도 가치 미분화 사회에서의 꼴불견들이다.
합리적인 제도분화와 분업, 그리고 각자의 직책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는 생태가 형성되기까지는 ‘성완종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현재 진행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