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하던 남편 마이어에게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근처에 사는 당신 친구라는 사람에게 일찌감치 돈을 투자해보면 어때요?”. 도로시가 이야기한 친구는 그무렵 네브라스카주의 작은 시골도시 오마하에서 점점 명성을 얻고 있던 ‘젊은 펀드매니저’ 였습니다.
 |
| 마이어와 도로시 크립케(Kripke) 부부. |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알아채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이어의 ‘동네 친구’는 바로 워런 버핏(Warren Edward Buffett) 이었습니다. 투자의 달인이자, 개인 재산만 60조원이 넘는 현재 지구상 최고 부자 중 한사람입니다.
당시 마이어는 망설였습니다. 명성이 자자하다고 하더라도 버핏은 아직은 ‘젊은 매니저’ 였기 때문입니다. 친구 사이에 돈문제를 끌어들이는 것도 개운치는 않았습니다.
마이어는 고심끝에 투자를 결정합니다. 친구인 버핏에게는 신념과 재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이어는 버핏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버핏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받아들이는 투자금액의 최저선이 15만달러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돼야 투자를 받아줬습니다. 마이어는 이후 3년에 걸쳐 버핏을 설득합니다. 단순히 돈을 불리기 보다는 버핏의 투자 철학과 사회적책임감을 믿고 지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버핏은 마침내 마이어의 돈을 투자해주기로 결정합니다.
마이어의 투자는 옳았습니다. 부부가 맡긴 6만7000달러는 빠르게 불어납니다. 크립케 부부는 순식간에 백만장자가 됐고, 20년 정도 지난 1990년대에는 그들이 맡긴 돈이 무려 2500만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현재 가치로는 4000만달러, 우리돈 400억원 정도에 달하는 큰 돈입니다.
대단한 행운입니다.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친구에게 돈을 맡긴 것 뿐인데 큰 부자가 됐으니까요.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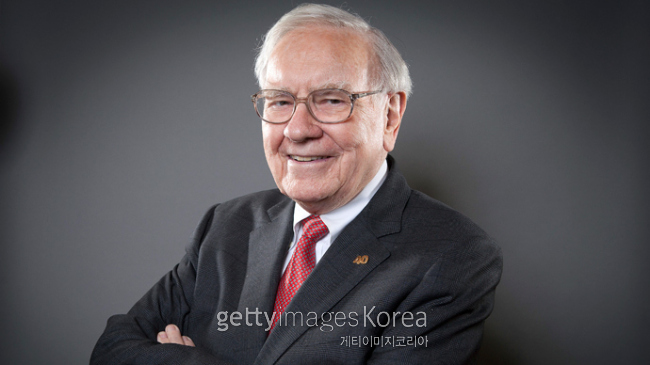 |
| 워런 버핏. |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투자 기간동안 부부는 버핏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변하게 됩니다. 돈을 어떻게 벌고 써야할 지는 물론, 부자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같은 것들을 깨닫게 되지요. 천성도 성실했던 부부는 행운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된 뒤에도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저택 대신 월세 900달러 짜리 아파트에서 살았고, 일도 계속 했습니다. 돈을 쓰는 데 여생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기부에 매달렸습니다. 거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700만 달러를 기부해 뉴욕 맨해튼에 유대신학대학생을 위한 도서관을 세웠고,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8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오마하에 살던 어려운 젊은이들이나 빈민들에게도 수백만달러의 자선을 배풀었습니다. 크립케가의 안주인 도로시는 지난 2000년 사망했습니다. 남편인 마이어는 무려 100세까지 장수하다 지난해 5월 사망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좋은일을 많이 한 탓일까요.
넓게 보면 버핏이 불려준 건 크립케 부부의 잔고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풍족한 두사람의 ‘진짜 부자’를 탄생시켰고, 그들의 돈과 마음은 결국 지역사회와 미국을 조금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물론 버핏 자신도 충실한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3년 한해 동안만 무려 26억3000만 달러, 우리돈 2조8000억원 정도를 기부했습니다. 그간 버핏이 기부한 돈을 모두 합치면무려 2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부자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재산 전체가 넘는 개인돈을 기부한 셈입니다.
버핏은 빌 게이츠가 만든 자선 재단 ‘기빙 플렛지(The Giving Pledge)’에 가입해 “죽기 전에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5위 부자인 래리 엘리슨에게 ‘억만장자들이 기부행위를 공개적으로 해야 다른 사람들의 기부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조언해 그를 기빙 플렛지에 가입하게 한 것도 버핏입니다. 버핏이 왜 ‘오마하의 현인(Oracle of Omaha)’으로 불리우는 지 납득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겠지요.
연말연시 한국사회는 부자들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땅콩 회항’ 사태는 결국 해당 재벌 일가의 구속으로 까지 이어졌고, 부자들에 대한 반감은 여느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와중에 신년벽두부터 ‘옥중 재벌 총수의 사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격론을 낳고 있습니다. 사면을 주장하는 분들이 내세운 이유는 언제나 처럼 ‘경제위기 돌파’입니다. 충분히 납득은 됩니다만, 매번 등장하는 ‘경제위기론’은 솔직히 이제 좀 식상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새해 첫날 재벌 총수들이 쏟아낸 신년사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표현도 ‘경제 위기’와 ‘올해가 더 어렵다’ 더군요. 사실 ‘위기론’은 2급 정도의 리더들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특급 리더’들은 위기 때 위기감만 강조하기 보다는, 오히려 희망과 의지를 불러일으켜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재벌에게 원하는 것도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재벌들에게 반감을 가진 보통의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땅에서 부자를 몰아내자”가 아닐 것입니다. 세 번에 한 번 혹은 다섯번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좋으니, 주변 사람들과 우리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를 보게해달라는 것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sw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