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도 새벽에 눈만 뜨면 마당으로 나가게 된다. 봄에는 이불 속의 등 따순 맛에 벌떡 일어나기가 귀찮다가도 식물들의 웅성거림이 들리는 듯한 느낌 때문에 이부자리를 박찼던 것 같다. 밖에 나가 나날이 부드러워지는 공기와 흙의 감촉을 즐기며 마당을 어슬렁거리노라면 땅 속에서 아직 움트기 전의 식물들이 부산하게 웅성대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호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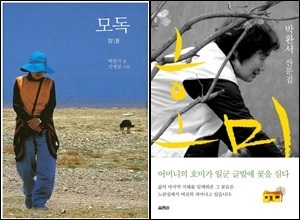
고(故) 박완서 작가의 두 에세이 ‘모독’과 ‘호미’는 아마도 ‘가장 높고 낯선 땅에서 만나는 하늘빛’과 ‘가장 낮고 익숙한 땅에서 만지는 흙의 감촉’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 2011년 작고한 박완서 작가의 티베트ㆍ네팔 여행기 ‘모독’과 산문집 ‘호미’가 최근 개정판으로 나란히 재출간됐다. ‘모독’이 첫 선을 보인 것이 1997년, ‘호미’가 세상에 나온 것이 2007년이니까 생전 작가의 의도인 줄은 짐작할 바 없으나 때마침 새단장하고 함께 맞으니 특별히 뜻깊고 절묘한 대구를 이룬다. 작가가 스스로 말한대로 티베트는 ‘내 생애에서 밟아보는 가장 높은 지대’였고, 향년 80세로 삶을 마무리하기까지 13년을 살며 ‘호미’의 산문을 써내려갔던 경기도 구리의 ‘아치울 노란집’은 고인의 평생 삶이 깃들었던 가장 낮고 가까운 마당이었다. ‘모독’에는 티베트 여정에 동행했던 시인이자 사진작가 민병일의 카메라로 잡아낸 이국적인 풍경이 나란히 놓였고 아치울 노란집 마당을 이어받은 박완서 작가의 딸 호원숙 작가는 ‘호미’에서 어머니의 글에 정감어린 꽃 그림을 보탰다.

박 작가는 생전 쓴 ‘호미’의 ‘작가의 말’에서 “내 나이에 ‘6’자가 들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촌철살인(寸鐵殺人)의 언어를 꿈꿨지만 요즈음 들어 나도 모르게 어질고 따뜻하고 위안이 되는 글을 소망하게 되었다”고 했다. 정말 66세에 낸 ‘모독’에는 길벗이었던 민병일 작가가 추억하는 ‘박꽃같은 미소’만이 아니라 화나고 불편하고 당황스러운 표정, 때로는 자기환멸에 이른 속내까지 서슴없이 보여주고, 그 보다 더 많게는 장난기 어린 문장까지도 툭툭 던진다.
하늘 아래 첫 땅에 얽힌 박 작가의 눈과 말은 감탄과 외경, 낯섬과 친숙함, 태고와 종말을 넘나든다. 고지대라 풀 한 포기 없는 산을 보면서 “바위도 없이 갈색 흙으로 된 산들이 우기에 파인 자국을 주름처럼, 거대한 발가락처럼, 사타구니처럼 드러내고 대책 없이 서 있는 꼴은 황량과 파렴치의 극치”라고 일컫는 문장은 아무나 이를 경지가 아니다. 허기증과 고산증으로 고생하고, 라면 맛에 헛헛함을 달래고, 버스가 고장나 걷기도 하는, 나그네의 다양한 일화들도 당시에는 심각했을 터이나 지금은 읽는 이까지도 함께 겪어 웃음이 절로 나는 추억담으로만 들린다.

무엇보다 노작가의 시선의 끝은 늘 사람으로 향한다. 말과 사유의 종착점은 인간 세계다. 작가는 관광객만 보면 떼로 모여들어 구걸하는 거리의 사람들, 아무 경계 없이 나그네에게 곁을 내주고 먹을 거리를 나누는 이들, 땟국에 전 옷을 입고도 위엄어린 자존감으로 고개 숙이는 법 없는 유목민, 원주민 대신 주인 행세하는 뻔뻔한 중국 한족 등을 만나며 다양한 감회를 토로한다. 인간의 바닥을 보는 환멸과 괴로움도 있고, 오염되지 않은 순수와 호의를 만나는 감동도 있다. 텐트촌의 목동을 보면서 “때에 찌들어 갑옷같이 된 옷을 입고 머리에는 야크 머리보다 훨씬 간소한 장식을 하고 야크 뼈와 터키석으로 만든 장신구를 주렁주렁 걸친 목동은 수줍고 당당하고 섹시하기조차 하다”거나, “야성을 일깨우는 원초적 수컷스러움”이라고 하는 대목은 장난기도 느껴져 흥미롭다.

사방이 불교 유적지인 여행지에서 온갖 화려한 치장과 육감적인 모습으로 사원에 자리잡은 불상들과 가난하고 굶주리면서도 윤회와 해탈을 구하는 티베트인을 만나며 느낀 아이러니도 작가의 유려한 글로 담긴다. 특히 부처에 올라탄 여인, 즉 환희에 이른 남녀 합환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조각이나 벽화에 대한 묘사도 흥미롭다. 작가는 “부처와 인간, 성과 속이 헷갈렸다. 내가 보기에는 있는 그대로의 저 사람들이 바로 부처로 보이고 절 안의 부처가 훨씬 더 인간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라거나 “그들(티베트인)이야말로 욕망을 초극한 부처고, 사치를 극한 절 안의 부처들이 오히려 번뇌 중의 속인처럼 여겨져서이다.”라고 이른다.

작가는 특히 글 곳곳에서 거듭해서 원주민의 땅을 빼앗아 지배자로 행세하는 중국 한족에 대한 분노나 경멸감을 내보인다. “티베트족에 비해 옷 잘 입고, 얼굴 깨끗하고, 거드름이 몸에 밴 그들을 보면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의 일본 사람 생각이 나서 배알이 꼴린다.” “우리 땅이 남의 식민지였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 요직과 부를 차지한 일본인들의 표정도 그렇게 방약무인했다.”는 문장들이 그렇다.
그리하여,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모독’이라는 단어로 삶과 인간 사회에 대한 성찰을 전한다. 작가가 포함된 일행은 여정에 지쳐 한족이 운영하는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주문한 요리가 입에 맞지 않아 고스란히 남기고 미리 가져간 라면만 끓여 먹게 됐다. 그런데 식당 바깥에선 음식을 구걸하는 티베트인들이 잔뜩 몰려들었고, 오만한 표정으로 한국인들과 걸인들을 바라보던 한족 여주인은 남은 라면과 요리를 모두 한데 섞어 개죽처럼 만든 뒤 식당 밖에 던져줬다. 그마저도 서로 뺏으려고 아귀다툼이 일어날 것은 뻔했다. 박완서 작가는 “그 여자가 한 짓은 적선도 보시도 나눔도 아니었다”며 “같은 인간에게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건 순전히 인간에 대한 모독이었다.”고 썼다.

결국 하늘 아래 첫 땅에서 만난 모든 풍경은 노작가에게, 스스로에 대한 거울이었으니 마지막은 이렇다. “우리의 관광 행위 자체가 이 순결한 완전 순환의 땅엔 모독이었으니. 당신들의 정신이 정녕 살아 있거든 우리를 용서하지 말아주오. 랏채를 떠나면서 남길 말은 그 한마디밖에 없었다.”
‘모독’에 비한다면, ‘호미’는 흙과 자연을 곁에 두고 안착한 노작가의 말년의 따뜻함과 회고담이 치유를 전하는 글로 가득차 있다. 몸을 낮춰 땅을 마주하고 호미로 꽃밭을 일구며 체득한 자연의 질서와 그 안에 깃든 성찰이 담겼다. 계절을 달리하며 꽃이며 나무 이야기가 작가의 정서, 사유와 함께 펼쳐진다. 아울러 그가 겪은 역사를 자신의 삶 뿐 아니라 시어머니와 할아버지 등 가족, 그리고 이이화, 박수근, 이문구 등 작가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으로 보여준다.
su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