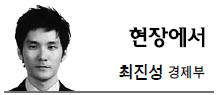 전북은행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키로 함에 따라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하면 전 은행권이 금융지주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금융지주체제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큰 틀에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전북은행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키로 함에 따라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하면 전 은행권이 금융지주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금융지주체제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큰 틀에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하나의 지주회사 밑에 은행ㆍ카드ㆍ보험ㆍ증권 등 금융회사가 계열화해 있어 경영상태나 자금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고객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가능하다. 중복된 업무는 통합하고, 인력ㆍ예산 등 자원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업다각화와 종합금융서비스 등 좋은 말이 많지만 한 마디로 ‘시너지 효과’로 압축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지주회사는 2001년 3월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빛은행을 중심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14개 금융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는 우리금융지주다. 이후 신한ㆍ국민ㆍ하나(외환) 등 대형 은행에 이어 지방은행도 금융지주체제로 전환했다.
국책은행 중에선 민영화를 추진 중인 산업은행이 2009년 11월 산은금융지주를 설립했고, 이듬해 6월 외국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이 한국씨티금융지주로 거듭났다.
첫 금융지주가 출범한 지 11년이 지났다. 뭔가 많이 바뀌었지만 크게 와닿는 것은 없다. 왜일까. ‘시너지’가 없다. 철저한 분석보다는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붙이다보니 금융지주회사의 장점을 못 살리는 것이다.
수익성 개선 효과는 찾아보기 힘들고, 커진 조직을 통합ㆍ운영하는 것도 버겁다. 은행 편중도는 80~90%에 달하고, 무리한 인수ㆍ합병(M&A)으로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사전ㆍ사후 평가 없이 몸집만 키우다 손실비용만 늘어난 셈이다. 심지어 ‘자리보전용’으로 금융지주회사를 활용하다 톡톡히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여기저기서 ‘저성장ㆍ저금리 시대’가 도래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전 금융권이 건전성ㆍ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 금융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 ‘확대경영’이 맞는지, ‘내실 다지기’가 맞는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ip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