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 수요층 매수여부가 관건
선거·풍부한 유동성 감안을
올 들어 4번째 건설ㆍ부동산 부양책인 ‘5ㆍ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실효성이 관심사다. 특히 그동안 쉽게 손을 대지 못한 수도권 지역의 2년 거주 양도세 비과세 요건 폐지와 리츠 펀드법인의 민간 분양주택 매입 허용, 2종 일반주거지 층수제한 폐지, 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 확대(30가구 이상) 등 획기적인 고강도 지원 및 규제완화책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금융권의 PF대출 만기연장과 신규 자금 지원, 6조원대의 배드뱅크 설립, 국회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제정 등의 회생 해법이 병행 추진되며 건설 위기 탈출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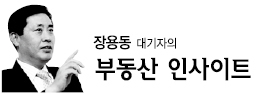 작금 문제의 원초적 뿌리는 주택건설경기 장기 침체다. 이런 점에서 시장과 업계를 동시 견인하는 수요 규제 완화와 공급 지원 처방의 방향은 긍정적이다. 서울 및 과천, 5대 신도시에 적용돼온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3년 보유(2년 거주 폐지)로 단일요건화, 131만가구의 비거주자에 대한 출구 제공은 물론 신규 주택 구매수요 유발 단초가 될 것이다. 리츠 펀드법인의 주택매입을 미분양주택에서 5년 임대 신규민영주택까지 확대 허용한 것 역시 미분양 및 전세난 해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다. 사업계획승인대상 확대로 다가구, 다세대 등 전월세용 소형주택 공급이 늘고 공공택지 PFV 전매 허용, 개발제한구역 5층 이내 공동주택 허용으로 안정적 주택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인위적 투기수요 진작과 난개발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 고육지책으로 대책 도입을 결정한 데에는 시장침체 견인이 화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단기적 효과는 역시 미미할 전망이다. 시장불황이 너무 깊기 때문이다. 집값 불안이 팽배, 매수세의 시장참여가 여전히 부정적이다. 게다가 건설업계의 잇단 구조조정 역시 악재다. 배드뱅크 설립 등 13조1000억원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지만 당장 부동산 PF대출 66조원 가운데 25조원이 연내 만기가 도래하고 2분기에 몰린 것만 13조8000억원대에 달한다. 저축은행은 오는 6월 결산을 계기로 재차 구조조정에 돌입, 건설사를 압박할 게 분명하다.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문제도 뇌관이다. 공사대금 등 유동화하기 어려운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30대 건설회사의 기업어음 지급보증 규모가 무려 15조원, 업체당 평균 5000억원에 달할 정도다. 내달 신용평가 후 워크아웃 대상업체가 발표되면 재차 또 한 번의 요동이 불가피하다.
작금 문제의 원초적 뿌리는 주택건설경기 장기 침체다. 이런 점에서 시장과 업계를 동시 견인하는 수요 규제 완화와 공급 지원 처방의 방향은 긍정적이다. 서울 및 과천, 5대 신도시에 적용돼온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3년 보유(2년 거주 폐지)로 단일요건화, 131만가구의 비거주자에 대한 출구 제공은 물론 신규 주택 구매수요 유발 단초가 될 것이다. 리츠 펀드법인의 주택매입을 미분양주택에서 5년 임대 신규민영주택까지 확대 허용한 것 역시 미분양 및 전세난 해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다. 사업계획승인대상 확대로 다가구, 다세대 등 전월세용 소형주택 공급이 늘고 공공택지 PFV 전매 허용, 개발제한구역 5층 이내 공동주택 허용으로 안정적 주택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인위적 투기수요 진작과 난개발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 고육지책으로 대책 도입을 결정한 데에는 시장침체 견인이 화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단기적 효과는 역시 미미할 전망이다. 시장불황이 너무 깊기 때문이다. 집값 불안이 팽배, 매수세의 시장참여가 여전히 부정적이다. 게다가 건설업계의 잇단 구조조정 역시 악재다. 배드뱅크 설립 등 13조1000억원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지만 당장 부동산 PF대출 66조원 가운데 25조원이 연내 만기가 도래하고 2분기에 몰린 것만 13조8000억원대에 달한다. 저축은행은 오는 6월 결산을 계기로 재차 구조조정에 돌입, 건설사를 압박할 게 분명하다.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문제도 뇌관이다. 공사대금 등 유동화하기 어려운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30대 건설회사의 기업어음 지급보증 규모가 무려 15조원, 업체당 평균 5000억원에 달할 정도다. 내달 신용평가 후 워크아웃 대상업체가 발표되면 재차 또 한 번의 요동이 불가피하다.결국 건설 위기는 시간과 시장의 싸움이다. 건설-금융업계 간 유기적 협조, 정부의 대출연장 개입과 저축은행의 부동산 대출비중 규제(50%) 유예가 관건이다. 조기 매듭을 위해서는 건설업체들의 오너 출자전환 등 희생도 고려돼야 한다. 금융권 역시 사업 리스크를 떠안는 등 기업회생에 역점을 두어야 공멸을 피할 수 있다. 일본의 장기침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모두 부동산에서 유발된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어 해결의 키가 주택시장 정상화에 있는 만큼 보다 전향적인 세제 개편,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완화책, 수요자 금융지원책 등 불쏘시개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불황을 벗어나면 주택시장은 재차 수요가 일 것이라는 전제도 고려돼야 한다. 국토해양부가 주택 절대부족현상 해소와 소가구 및 고령화, 임차시장 활성화 등의 시장환경 변화에도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39만~42만가구(수도권 23만~25만가구)의 유효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구나 내년에 부동산과 연관성이 깊은 총선 및 대선이 있고 누적된 부양시책 효과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반영된다는 점, 바닥의 풍부한 유동성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ch10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