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해선 설 자리 없어
예술가의 고달픈 삶
지망생 철저히 인식해야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의 죽음은 예술가의 삶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단편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젊은 작가가 굶어죽었다는 얘기는 평소에 예술이나 예술가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그녀를 죽음으로 몬 사정을 살피도록 만들었다. 그녀의 죽음은 실은 지병 때문이었음이 밝혀졌지만, 예술가의 고달픈 삶에 대한 논의는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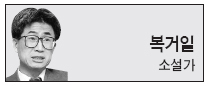 예술가의 삶이 일반적으로 고단한 것은 예술에선 독창성과 수월성이 다른 분야들에서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독창적이고 뛰어난 작품들은 높은 평가를 받지만, 모방한 작품들은 가치가 거의 없다. 보티첼리나 모네와 같은 거장들의 작품들은 거금에 거래되지만, 그것들을 충실하게 베낀 모사작들이나 사진들은 푸대접을 받는다. 대량으로 생산돼도 제값을 받는 컴퓨터 프로그램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예술가의 삶이 일반적으로 고단한 것은 예술에선 독창성과 수월성이 다른 분야들에서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독창적이고 뛰어난 작품들은 높은 평가를 받지만, 모방한 작품들은 가치가 거의 없다. 보티첼리나 모네와 같은 거장들의 작품들은 거금에 거래되지만, 그것들을 충실하게 베낀 모사작들이나 사진들은 푸대접을 받는다. 대량으로 생산돼도 제값을 받는 컴퓨터 프로그램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뛰어난 작품들은 큰 값을 받지만, 일류에 못 미치는 작품들은 아주 낮은 대접을 받는다. “우리가 더 많은 책들을 읽을수록, 작가의 진정한 기능은 걸작을 내놓는 것이고 다른 일들은 아무런 중요성도 없다는 것이 더 또렷해진다(The more books we read, the clearer it becomes that the true function of a writer is to produce a masterpiece and that no other tasks is of any consequence)”는 영국 문학평론가 시릴 코널리(Cyril Connolly)의 얘기는 자신의 재능이 작음을 느끼는 예술가들의 가슴마다 아프게 울릴 것이다.
자연히, 독창적이지도 뛰어나지도 않은 예술가들은 설 땅이 아주 좁다. 대부분의 지적 분야들에선 평범한 재능을 지닌 사람들도 나름으로 사회에 유용한 일들을 하면서 무난한 삶을 꾸릴 수 있다. 세무사나 회계사를 고를 때, 누가 독창성이나 수월성을 크게 따지는가? 그러나 평범한 예술가들은 높은 평가나 명성은 그만두고라도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기 어렵다. ‘승자 독식(winner-take-all)’ 현상은 예술 분야에서 가장 뚜렷하다.
그래서 예술가가 되겠다는 결심은 아주 작은 가능성에 자신의 평생을 거는 위험한 내기라 할 수 있다. 예술적 재능을 일찍 알아보기는 어렵고, 재능이 있더라도 걸작을 쓴다는 보장이 없고, 걸작을 써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평판을 얻은 예술가들도 흔히 가난한 삶을 꾸린다. 예술가를 지망하는 젊은이들은 이런 사정을 깨달아야 한다.
불행하게도, 보기에 따라선 다행스럽게도, 예술의 여신의 아름다운 자태를 엿본 사람들은 결코 그녀를 잊을 수 없다. 그래서 보일 듯 보일 듯 좀처럼 보이지 않는 그녀를 찾아 평생을 헤맨다.
꽃은 피는 대로 보고
사랑은 주신 대로 부르다가
세상에 가득한 물건조차
한 아름팍 안아보지 못해서
전신을 다 담아도
한 편에 이천 원 아니면 삼천 원
가치와 값이 다르건만
더 손을 내밀지 못하는 천직
이산(怡山) 김광섭(金珖燮)의 <시인>엔 예술가의 그런 처지를 투정 없이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서글픔의 그늘을 품고 받아들인 시인의 마음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