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 ‘국민인식 조사’에서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았지만 지불의사는 낮았다. 공적보험에 기대고는 싶지만 내돈은 아깝다는 공짜심리가 반영된 증거다.
그 틈새를 벌리고 있는 게 실손보험이다. 2007년 발매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급여 밖 환자의 본인부담액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건강보험에 연계 설계돼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보완한다는 명분으로 발매됐다.
국민 65%(3200만명) 가량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도입 9년을 넘기면서 내재됐던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보험료 인상의 시작이다. 손보사들은 2014년 손해율이 최대 137.6%라고 주장, 올해 초 보험료를 22∼44% 올렸다.
그러나 손해율 산정방식에 문제가 제기됐다. 손해율 계산 때 ‘부가보험료 수입’을 제외하고 ‘위험보험료 수입’만을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보험료는 위험보험료(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와 부가보험료(기업 운영비용, 판매비용, 영업이익)로 구성된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이 방식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같이 계산하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9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인상을 위해 손해율을 부풀렸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익이 예전만 못하자(또는 보험사들 말대로 손실률이 높아지자)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또 고령자나 병력이 있는 자(기왕증)의 가입 거부, 보험금 지급 거부도 예사로 벌어진다. 보험이 가장 필요한 이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역설에 봉착한 것이다.
과잉진료, 의료쇼핑도 횡행하고 있다. 사소한 질병에도 MRI 진단이나 고액 처치가 권유되기도 한다. 진료비는 건강보험 급여진료와 실손보험 영역의 비급여진료가 섞여 있다. 과잉진료가 늘수록 건강보험 지출도 늘어나는 구조인 것이다. 건강보험이 황폐화돼 각자도생해야 하는 미국의 처지가 선명해진다.
사태의 근본 원인은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에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장률은 62.3%로, OECD 평균 80%에 비해 훨씬 낮다. 이는 도입 초기부터 이어져온 ‘저부담-저급여’ 정책 탓이다. 저수가는 비급여 진료를 인정할 수 밖에 없고, 비급여가 양산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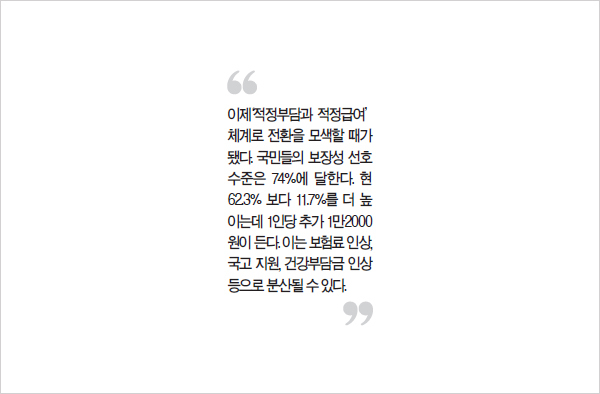
이제 ‘적정부담과 적정급여’ 체계로 전환을 모색할 때가 됐다. 국민들의 보장성 선호수준은 74%에 달한다. 현 62.3% 보다 11.7%를 더 높이는데 1인당 추가 1만2000원이 든다. 이는 보험료 인상, 국고 지원, 건강부담금 인상 등으로 분산될 수 있다.
또 실손보험 평균 보험료는 34만3000원으로 건강보험료 평균(9만4000원)의 3.6배에 달한다. 이 격차만 줄여도 적정부담-적정급여는 달성될 수 있는 목표다. 마침 21조1700억원이란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쌓인 지금, 적정부담-적정급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적기다.
freihei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