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은 정상적인 정치토론의 모습이 아니다. 이번 토론회의 가장 큰 패자는 시청자가 아닌가 싶다, 75분간 서로 자기들 얘기밖에 안했다. 알맹이 없는 논쟁이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1차 미 대선토론에 대한 NBC 방송의 척 토드 정치부 기자의 평가다. 영국 가디언지의 질 아브람슨 칼럼니스트는 여기서 한 발 더 갔다. “희망을 주는 토론은 아니었다. 유권자들은 두 후보 모두가 역겹다는 걸 알아챘을 그런 토론이었다”고 혹평했다.
“이것은 정상적인 정치토론의 모습이 아니다. 이번 토론회의 가장 큰 패자는 시청자가 아닌가 싶다, 75분간 서로 자기들 얘기밖에 안했다. 알맹이 없는 논쟁이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1차 미 대선토론에 대한 NBC 방송의 척 토드 정치부 기자의 평가다. 영국 가디언지의 질 아브람슨 칼럼니스트는 여기서 한 발 더 갔다. “희망을 주는 토론은 아니었다. 유권자들은 두 후보 모두가 역겹다는 걸 알아챘을 그런 토론이었다”고 혹평했다.‘세기의 대결’이라던 미 대선토론은 그렇게 ‘헛 껍데기’ 잔치로 싱겁게 끝이 났다.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75분간 벌어진 불꽃튀는 설전은 대통령 후보들의 모습이라곤 찾아 볼 수 없었다. 자신의 공약만 나열하는가 하면, 상대 후보의 말을 자르고, 중간에 끼어드는 볼성사나운 모습은 75분간 계속됐다. 분노섞인 고성만 지른 트럼프는 그렇다 치더라도, 힐러리 역시 “자만함을 다시 한 번 보여줬고”(아브람슨), “교실에서 제일 똑똑한 학생”(영국 정치평론가 크리스토퍼 베이런)처럼 굴었다.
대선토론은 이래야 한다는 교본은 없다. 토론은 상대를 그리고, 지켜보는 이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건 초등학생들도 안다. “그렇지. 그를(그녀를) 선택하길 잘했어”라는 확신감을, 아니면 “그렇다면 OOO를 찍는게 나을 듯 싶은데”라는 투표 결정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토론은 워싱턴 정치에 대한 불만만 키웠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트럼프 팬덤’ ‘극우 포퓰리즘의 득세’라는 전세계적인 기현상 뒤에는 기성정치에 대한 분노와 혐오가 숨어있다는 걸 애써 무시한 셈이다.
‘국민’이라는 주어가 빠진 기성정치는 우리도 똑같다. 청와대는 ‘비상시국’론에 빠져 설득과 소통이라는 정치의 최대 행위는 안중에도 없다. “이런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폭로성 발언들…”(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비상시국에 굳이…유감스럽습니다”(24일 장차관 워크숍) 같은 비상시국론은 눈을 감고, 귀를 닫은 것만 같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거야(巨野)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해 “지금 안보, 경제가 큰 위기에 처해있고.…기껏 한다는게 대통령을 흔들어서 무릎을 꿇리려 하고 있다”며 국회의 의무 1장 1절 국정감사는 안중에도 없다. 야당이라고 해서 큰 소리칠 처지도 아니다. 야당의 정치 교본에서도 협치는 찾아 볼 수 없다. 나의 말만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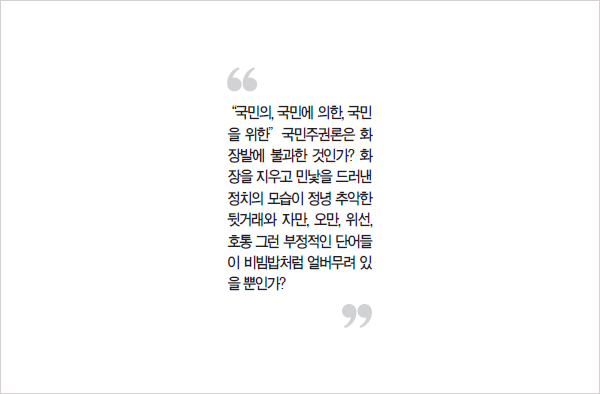
저 유명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주권론은 화장발에 불과한 것인가? 화장을 지우고 민낯을 드러낸 정치의 모습이 정녕 추악한 뒷거래와 자만, 오만, 위선, 호통 그런 부정적인 단어들이 비빔밥처럼 얼버무려 있을 뿐인가? “그들의, 그들에 의한, 그들을 위한” 게 정치의 민낯일까? 정상의 시대에 정상적인 토론을 보고, 정상적인 정치를 보는 게 소박한 꿈은 아니지 않나. 언제까지 “비정상의 정상”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나.
hanimomo@heraldcorp.com








